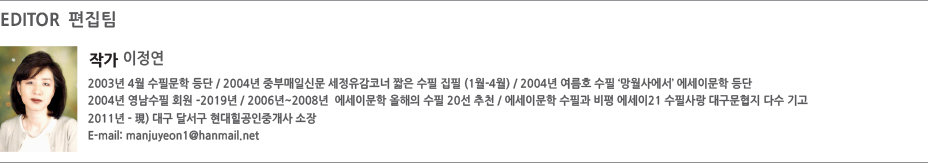커뮤니티

[수필] 사리암
2024-07-24
문화
 문화놀이터
문화놀이터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수필] 사리암
'글. 이정연'
초등학교 때 여름의 끝 무렵이었다. 언니는 분홍색보자기에 양말과, 공책을 반으로 잘라서 만든 수첩과 연필을 넣고 찐쌀 몇 홉을 비닐봉지에 넣어 싸고 있었다. 2박 3일간의 수학여행을 갈 참이었다. 아버지 어머니의 '못 간다.' '간다.'로 며칠 입씨름 후에 얻어낸 수확이라 언니는 흥분에 들떠 마치 통통 튀는 공 같았다. 보자기 끈을 묶는 언니에게 그 찐쌀 내게 좀 나눠주고 가라고 했는데 여행가서 언니가 배곯으면 집도 아닌데 어쩔 거냐고 어머니가 금방 호되게 나무라셨다. 먹고 싶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언니는 여행을 마치고 해쓱하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한 채 설렘과 기쁨에 들뜬 모습으로 돌아왔다. 아마 태어나서 산골 밖으로 나가보긴 그때가 처음이었으리라. 가장 먼저 나를 찾더니 땟국이 흐르는 보자기에서 절반이나 남긴 찐쌀과 용돈 전부를 들였음직한 예쁜 목걸이를 꺼내 주었다. 그 뿐이 아니었다. 여행지 운문사 사리암엔 산 중턱에 폭포가 있는데 수량이 어찌나 풍부한지 사리암에서 올려다보니 마치 땅속에서 분수가 솟구치는 것처럼 보이고 절 마당에 늘어선 큰 배나무에선 내 머리만한 배들이 땅바닥에 떨어져 널려있는데 아무도 눈길 주는 이 조차 없어 한 개 주워오고 싶었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 사리암 뒤 약수가 나오는 바위는, 예전에 한 사람이 살면 한 사람 분량의 쌀이 나오고, 두 사람이 살면 두 사람 분량의 쌀이, 열 사람이 살면 열 사람이 먹을 분량의 쌀이 나왔는데 어느 날 더 많은 쌀이 나오게 하려고 스님이 구멍을 넓힌 뒤부터는 쌀 대신 물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바위 속에 숨어있던 부처님이 쌀을 조금씩 내 보내 주시는 게 아닐까 하고 마른침을 삼키며 들었다. 내가 하도 눈을 반짝이며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하다가 한 번만 더해 달라고 조르니까 곁에서 낡은 양말을 꿰매던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너도 몇 년 만 있으면 수학여행 갈 수 있다고 나를 달래셨다. 몇 번이고 묻는 내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언니는 집을 떠난 사이에 훌쩍 커서 돌아온 것 같았다.
어머니의 약속대로 몇 년이 지났을 때 난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다. 무슨 이유였는지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그 날 이후 사리암은 내게 더 안타까운 꿈이 되었다. 언젠가 꼭 가 봐야지. 어떻게 제삿날조차도 마음대로 먹어 볼 수 없는 배가 그렇게 많은지, 부디 내가 갈 때까지 머리만한 배가 달리는 나무가 베어지지 않아야할 텐데 하고는 세월이 꿈처럼 흘러가 버렸다.

어린 마음에 이루지 못한 꿈 하나가 새겨진 채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야 운문사에 몇 번 갈 일이 있었다. 결혼한 이듬해 봄에는 밭을 매고 계시던 아버님을 졸라 운문사에 들렀는데 서녘으로 더 많이 기울어진 해와 연만하신 아버님 어머님이 걱정되어 사리암엔 못 가고 범종 소리만 가슴에 담아왔다. 그 후에도 두 어 번 더 갈 일이 있었으나 일행이 있어 사리암 표지판만 안타깝게 확인했을 뿐이었고 마음먹고 몇 해 전에 갔을 때는 등산객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내가 한없이 안타까워하자 한 친구가 불교신도증이 있으면 사리암에 갈 수 있다는 말을 했고 나는 한 가닥 희망을 가졌으나 평생토록 부처님께 일 배도 드린 적이 없는 내게 불교신도증이 생길 리는 만무한 일이었다. 사리암에 가 볼 일은 어쩌면 이루지 못할 꿈이 되고 말았는데 우연히 사리암에 출입할 수 있는 신도증이 내게 생긴 것이다. 스님이 속해 있는 사진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스님의 강권으로 회원 모두가 강제로 불교 신자가 된 것이다.
사리암으로 가기 전날 나는, 내일 언니랑 꼭 함께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니 등산할 채비를 하고 기다려 달라며 퇴근길에 산 등산복과 등산화를 내밀었다. 언니는 “바쁜데 어디 갈려고?”하면서도 기대 에 찬 여운을 숨기지는 않았다. 나는 천천히 사리암을 오르면서 그 때 언니에게 정말 고마웠고 그래서 사리암에 꼭 와보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할 참이었다.
930년 보량국사가 초창한 사리암은 언니의 기억대로 아차 발을 잘못 디뎠다간 깎아지른 절벽 아래 계곡에 떨어질 것처럼 위험한 길이었다. 그대로 마셔도 좋을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계곡에선 도롱뇽 알이 말갛게 씻기고 저만치 까투리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는 산비탈 절벽에 위태위태하게 서 있는 사리암을 보니 공연히 감격스러워 눈물이 솟았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배나무는 한 그루만 남긴 채 다 베어지고 대신 암자 마당엔 새로 건물 두 동이 협소한 지면을 최대한 이용해서 신축되었다. 그 때는 한 줄로 겨우 서서 올라갔다는 토끼 길은 이제 불편 없이 왕복할 수 있도록 군데군데 시멘트를 발라놓아 언니를 많이 안타깝게 했지만 나는 그저 기억 속에 있던 사리암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나반존자(那畔尊者) 기도도량으로 신통력이 있다는 사리암은 과연 일반 등산객의 출입을 제한해야할 만큼 기도하는 신도들로 넘쳐 났다. 사리굴 앞에도 계단참에도 한 목소리로 나반존자를 부르는 간절한 모습으로 카메라를 든 내 등에 대고 자꾸만 절을 해 무안해서 몸둘 바를 몰랐다.
언니에게 해 주려던 이야기를 백장미처럼 예쁜 언니의 두 딸과 내 아이들이 함께 듣게 되었다. “이모 그런 소중한 추억이 있었어요?” 하며 감격하는 아이들과 “어머니 다음에 또 따라 와 드릴 게요.”하며 대단한 선심을 쓰듯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 넉넉지 않다는 게 꼭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그 때 내가 찐쌀이나 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거나 특별히 수학여행에 의미를 두지 않을 만큼 넉넉한 형편이었다면 나는 이 작은 암자를 진즉에 잊어버렸을 터였다. 함께 여행하지 못한 동생 때문에 제 몫으로 준 찐쌀도 다 먹지 못하고 용돈을 다 들여 목걸이를 사 준 그 정을 이렇게 오랫동안 간직할 수도 물론 없었을 것이다. 캄캄한 밤에 더욱 빛나는 별빛처럼 오래 오래 잊히지 않는 추억도 물론 없을 것이다. 가난함 속에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마음에 나는 평생 언니를 생각하면 춥지 않았고 나도 언니에게 그런 동생이 되어야지 다짐하게 되었다. 자꾸 가벼워지는 발걸음, 아물아물 오르는 아지랑이 너머로 엷게 물든 나뭇가지가 분홍빛을 띤다. 봄이다.
며칠 뒤 언니는 여행을 마치고 해쓱하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한 채 설렘과 기쁨에 들뜬 모습으로 돌아왔다. 아마 태어나서 산골 밖으로 나가보긴 그때가 처음이었으리라. 가장 먼저 나를 찾더니 땟국이 흐르는 보자기에서 절반이나 남긴 찐쌀과 용돈 전부를 들였음직한 예쁜 목걸이를 꺼내 주었다. 그 뿐이 아니었다. 여행지 운문사 사리암엔 산 중턱에 폭포가 있는데 수량이 어찌나 풍부한지 사리암에서 올려다보니 마치 땅속에서 분수가 솟구치는 것처럼 보이고 절 마당에 늘어선 큰 배나무에선 내 머리만한 배들이 땅바닥에 떨어져 널려있는데 아무도 눈길 주는 이 조차 없어 한 개 주워오고 싶었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 사리암 뒤 약수가 나오는 바위는, 예전에 한 사람이 살면 한 사람 분량의 쌀이 나오고, 두 사람이 살면 두 사람 분량의 쌀이, 열 사람이 살면 열 사람이 먹을 분량의 쌀이 나왔는데 어느 날 더 많은 쌀이 나오게 하려고 스님이 구멍을 넓힌 뒤부터는 쌀 대신 물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바위 속에 숨어있던 부처님이 쌀을 조금씩 내 보내 주시는 게 아닐까 하고 마른침을 삼키며 들었다. 내가 하도 눈을 반짝이며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하다가 한 번만 더해 달라고 조르니까 곁에서 낡은 양말을 꿰매던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너도 몇 년 만 있으면 수학여행 갈 수 있다고 나를 달래셨다. 몇 번이고 묻는 내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언니는 집을 떠난 사이에 훌쩍 커서 돌아온 것 같았다.
어머니의 약속대로 몇 년이 지났을 때 난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다. 무슨 이유였는지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그 날 이후 사리암은 내게 더 안타까운 꿈이 되었다. 언젠가 꼭 가 봐야지. 어떻게 제삿날조차도 마음대로 먹어 볼 수 없는 배가 그렇게 많은지, 부디 내가 갈 때까지 머리만한 배가 달리는 나무가 베어지지 않아야할 텐데 하고는 세월이 꿈처럼 흘러가 버렸다.

어린 마음에 이루지 못한 꿈 하나가 새겨진 채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야 운문사에 몇 번 갈 일이 있었다. 결혼한 이듬해 봄에는 밭을 매고 계시던 아버님을 졸라 운문사에 들렀는데 서녘으로 더 많이 기울어진 해와 연만하신 아버님 어머님이 걱정되어 사리암엔 못 가고 범종 소리만 가슴에 담아왔다. 그 후에도 두 어 번 더 갈 일이 있었으나 일행이 있어 사리암 표지판만 안타깝게 확인했을 뿐이었고 마음먹고 몇 해 전에 갔을 때는 등산객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내가 한없이 안타까워하자 한 친구가 불교신도증이 있으면 사리암에 갈 수 있다는 말을 했고 나는 한 가닥 희망을 가졌으나 평생토록 부처님께 일 배도 드린 적이 없는 내게 불교신도증이 생길 리는 만무한 일이었다. 사리암에 가 볼 일은 어쩌면 이루지 못할 꿈이 되고 말았는데 우연히 사리암에 출입할 수 있는 신도증이 내게 생긴 것이다. 스님이 속해 있는 사진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스님의 강권으로 회원 모두가 강제로 불교 신자가 된 것이다.
사리암으로 가기 전날 나는, 내일 언니랑 꼭 함께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니 등산할 채비를 하고 기다려 달라며 퇴근길에 산 등산복과 등산화를 내밀었다. 언니는 “바쁜데 어디 갈려고?”하면서도 기대 에 찬 여운을 숨기지는 않았다. 나는 천천히 사리암을 오르면서 그 때 언니에게 정말 고마웠고 그래서 사리암에 꼭 와보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할 참이었다.
930년 보량국사가 초창한 사리암은 언니의 기억대로 아차 발을 잘못 디뎠다간 깎아지른 절벽 아래 계곡에 떨어질 것처럼 위험한 길이었다. 그대로 마셔도 좋을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계곡에선 도롱뇽 알이 말갛게 씻기고 저만치 까투리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는 산비탈 절벽에 위태위태하게 서 있는 사리암을 보니 공연히 감격스러워 눈물이 솟았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배나무는 한 그루만 남긴 채 다 베어지고 대신 암자 마당엔 새로 건물 두 동이 협소한 지면을 최대한 이용해서 신축되었다. 그 때는 한 줄로 겨우 서서 올라갔다는 토끼 길은 이제 불편 없이 왕복할 수 있도록 군데군데 시멘트를 발라놓아 언니를 많이 안타깝게 했지만 나는 그저 기억 속에 있던 사리암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나반존자(那畔尊者) 기도도량으로 신통력이 있다는 사리암은 과연 일반 등산객의 출입을 제한해야할 만큼 기도하는 신도들로 넘쳐 났다. 사리굴 앞에도 계단참에도 한 목소리로 나반존자를 부르는 간절한 모습으로 카메라를 든 내 등에 대고 자꾸만 절을 해 무안해서 몸둘 바를 몰랐다.
언니에게 해 주려던 이야기를 백장미처럼 예쁜 언니의 두 딸과 내 아이들이 함께 듣게 되었다. “이모 그런 소중한 추억이 있었어요?” 하며 감격하는 아이들과 “어머니 다음에 또 따라 와 드릴 게요.”하며 대단한 선심을 쓰듯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 넉넉지 않다는 게 꼭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그 때 내가 찐쌀이나 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거나 특별히 수학여행에 의미를 두지 않을 만큼 넉넉한 형편이었다면 나는 이 작은 암자를 진즉에 잊어버렸을 터였다. 함께 여행하지 못한 동생 때문에 제 몫으로 준 찐쌀도 다 먹지 못하고 용돈을 다 들여 목걸이를 사 준 그 정을 이렇게 오랫동안 간직할 수도 물론 없었을 것이다. 캄캄한 밤에 더욱 빛나는 별빛처럼 오래 오래 잊히지 않는 추억도 물론 없을 것이다. 가난함 속에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마음에 나는 평생 언니를 생각하면 춥지 않았고 나도 언니에게 그런 동생이 되어야지 다짐하게 되었다. 자꾸 가벼워지는 발걸음, 아물아물 오르는 아지랑이 너머로 엷게 물든 나뭇가지가 분홍빛을 띤다. 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