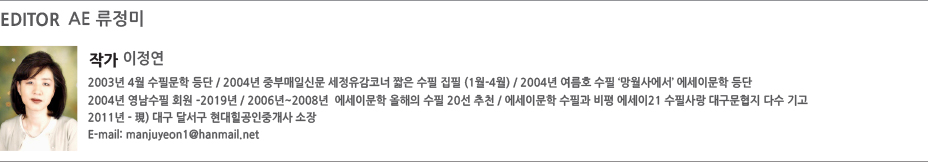커뮤니티

[수필] 메리제인 슈즈
2023-06-14
문화
 문화놀이터
문화놀이터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수필] 메리제인 슈즈
'글. 이정연'
빈소는 마치 시골장터처럼 왁자했다. 눈자위가 붉은 사람은 고인의 딸뿐 아무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다. 지고한 한 생애가 끝나도 이렇게 남은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리 연세가 많다지만 고인의 자식들조차 문상객과 환담을 나누는 모습에 나는 그만 머리가 아파져서 어서 일어서고 싶었다.
“난 그만 가봐야겠어!”친구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일어섰을 때 H도 함께 일어섰다. 우산꽂이에서 우산을 찾는 동안 H는 정확하게 내 구두를 찾아 마치 중세의 기사들이나 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신발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 들고 신으라는 눈빛을 보냈다.
고향 친구 엄마의 장례식이라 모두 잘 아는 사람들이다.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더러는 눈으로 우릴 배웅하고 있었다. 내가 당황하며 사양하는 것도 아랑곳 않고 H는 아무렇지 않게 신발을 들고 있었다. 신지 않으면 안 일어나겠다는 흔들림 없는 표정 등 뒤의 시선을 피하려면 어서 자리를 벗어나는 것만이 답일 것 같았다. 신발을 신자 마치 H는 아기에게 하듯이 조심스레 발목 끈을 채워주고는 손을 툭툭 털고 웃어 보였다. 나도 마주 웃었지만 행여 H가 고향 선후배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함께 우산을 받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물어보고 싶었다. 그냥 신발을 찾아서 앞에만 놓아주어도 친절인데 고향 사람들 앞에서 왜 무릎까지 꿇으면서 신겨 주느냐고. 그러나 나는 묻지 못했다. 대신 빗속의 침묵을 H가 깼다.
“초등학교 때 하굣길 생각나? 자주 이웃동네 아이들에 잡혀 있었는데.....”
“ 아니 나는 그 생각은 안나. 싸운 기억도 없고. 그때 나는 뭐 하고 있었어?”
악을 쓰고 울지나 않았을까 하고 물어보았다. 그러나 나는 싸움하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고 늘 발아래 지나가는 개미의 행렬을 보거나 먼 하늘을 구름을 보느라 아예 싸우는 남학생들에게 관심이 없더라고 했다. 동무들은 자주 그런 싸움을 했고 그때마다 H가 싸움을 말려서 각자의 동네로 보냈다는데 나는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았다. 미안한 표정으로 서있는 내게 H가 어서 타라며 문을 열어 주었다. 내가 운전석에 앉고 안전띠를 매고 저녁 비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말없이 배웅해 주었다. 아마 초등학교 때도 그랬을 것이다.

사실 H는 공부도 잘했고 준수했으며 다른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나도 그때 다른 친구들처럼 H를 좋아했을 것이다. 상처받는 게 두려운 나는 아무에게도 먼저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 아이였다. 어쩌면 상처받지 않으려고 아예 관심도 두지 않았을지 모른다.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초등학교 때 하굣길이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까마득한 세월 건너 기억은 늘 꿈속의 일처럼 아련할 뿐 아무것도 구체적이진 않다. 또 언젠가 친구들이 모여 첫사랑을 화제로 떠들썩했을 때 “사랑을 어떻게 말로 하냐?” 던 H의 모습도 기억났다. 차 트렁크에 두었던 신발을 가져와 신발장에 넣어 두었다. 반짝이는 구두코가 내게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지!’ 가만히 속삭이는 것 같다.
만화 주인공이 잘 신어서 그 주인공 이름을 붙인 메리제인 슈즈는 둥근 앞코 발등에 끈이 있는 구두다. 편하고 어려 보이고 끈이 있어 잘 벗겨지지 않아 활동적이다. 늘 바쁘게 돌아다니던 내가 신으면 딱 좋겠다 싶어 인터넷으로 샀다. 날렵하지만 둥글고 예쁜 앞코가 발에 딱 맞는 크기, 높지도 낮지도 않은 굽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긴 치마에도 잘 어울리고 종아리가 드러나는 짧은 치마에도 좋고 긴 바지와도 찰떡처럼 잘 맞았다. 그런데 예쁜 숙녀가 까다롭듯이 신발도 그런지 다른 새 신발처럼 발톱이나 뒤꿈치가 아픈 게 아니라 발 옆이 아팠다. 새 신발이라 그렇겠지 하고 하루 이틀 참아보았지만 조금만 걸으면 깜짝 놀랄 만큼 발 옆 부분이 아팠다. 누구 맞는 사람에게 줄까 하다가도 예쁜 모양을 보면 또 그 마음이 가셨다. 궁리 끝에 차 트렁크에 넣어 두고 장례식 갈 때만 신었다. 출근했다가 갑자기 조문해야 할 때 더없이 좋았다. 장례식장 주차장에 도착해 꺼내 신으면 가까운 거리이니 발도 아프지 않고 잘 안 신으니 진열장의 신발처럼 깨끗하고 반짝거려 문상 옷차림에 격을 더해 주었다.
나는 아침마다 신발장 문을 열고 인사한다. ‘하이 메리제인!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그럼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을 듯 기분이 좋아진다. 남들 시선쯤 하나 불편해하지 않고 들어올 때 미리 보아둔 내 신발을 망설임 없이 찾아 신겨준 그 마음을 메리제인 슈즈는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가끔은 메리제인 슈즈가 내게 짓궂게 묻는다. ‘다른 남자를 가슴에 두어도 되는 거야?’ 나는 얼른 말한다. ‘안되지 안 되고말고. 그럼 어디 네가 한 번 꺼내 줘 볼래?’ 그럴 때는 메리제인 슈즈도 말이 없다. 대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빗장을 걸어 막을 수 있지만 마음의 문에는 빗장이 없다. 가능한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불가능한 일은 신들이나 하는 것이다. 나는 그저 한 남자가 꾹꾹 가슴에 눌러 두었다가 나도 저도 흔들리지 않을 나이에 가만히 전해준 속마음을 그냥 따뜻해할 뿐이다.
“난 그만 가봐야겠어!”친구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일어섰을 때 H도 함께 일어섰다. 우산꽂이에서 우산을 찾는 동안 H는 정확하게 내 구두를 찾아 마치 중세의 기사들이나 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신발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 들고 신으라는 눈빛을 보냈다.
고향 친구 엄마의 장례식이라 모두 잘 아는 사람들이다.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더러는 눈으로 우릴 배웅하고 있었다. 내가 당황하며 사양하는 것도 아랑곳 않고 H는 아무렇지 않게 신발을 들고 있었다. 신지 않으면 안 일어나겠다는 흔들림 없는 표정 등 뒤의 시선을 피하려면 어서 자리를 벗어나는 것만이 답일 것 같았다. 신발을 신자 마치 H는 아기에게 하듯이 조심스레 발목 끈을 채워주고는 손을 툭툭 털고 웃어 보였다. 나도 마주 웃었지만 행여 H가 고향 선후배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함께 우산을 받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물어보고 싶었다. 그냥 신발을 찾아서 앞에만 놓아주어도 친절인데 고향 사람들 앞에서 왜 무릎까지 꿇으면서 신겨 주느냐고. 그러나 나는 묻지 못했다. 대신 빗속의 침묵을 H가 깼다.
“초등학교 때 하굣길 생각나? 자주 이웃동네 아이들에 잡혀 있었는데.....”
“ 아니 나는 그 생각은 안나. 싸운 기억도 없고. 그때 나는 뭐 하고 있었어?”
악을 쓰고 울지나 않았을까 하고 물어보았다. 그러나 나는 싸움하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고 늘 발아래 지나가는 개미의 행렬을 보거나 먼 하늘을 구름을 보느라 아예 싸우는 남학생들에게 관심이 없더라고 했다. 동무들은 자주 그런 싸움을 했고 그때마다 H가 싸움을 말려서 각자의 동네로 보냈다는데 나는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았다. 미안한 표정으로 서있는 내게 H가 어서 타라며 문을 열어 주었다. 내가 운전석에 앉고 안전띠를 매고 저녁 비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말없이 배웅해 주었다. 아마 초등학교 때도 그랬을 것이다.

사실 H는 공부도 잘했고 준수했으며 다른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나도 그때 다른 친구들처럼 H를 좋아했을 것이다. 상처받는 게 두려운 나는 아무에게도 먼저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 아이였다. 어쩌면 상처받지 않으려고 아예 관심도 두지 않았을지 모른다.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초등학교 때 하굣길이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까마득한 세월 건너 기억은 늘 꿈속의 일처럼 아련할 뿐 아무것도 구체적이진 않다. 또 언젠가 친구들이 모여 첫사랑을 화제로 떠들썩했을 때 “사랑을 어떻게 말로 하냐?” 던 H의 모습도 기억났다. 차 트렁크에 두었던 신발을 가져와 신발장에 넣어 두었다. 반짝이는 구두코가 내게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지!’ 가만히 속삭이는 것 같다.
만화 주인공이 잘 신어서 그 주인공 이름을 붙인 메리제인 슈즈는 둥근 앞코 발등에 끈이 있는 구두다. 편하고 어려 보이고 끈이 있어 잘 벗겨지지 않아 활동적이다. 늘 바쁘게 돌아다니던 내가 신으면 딱 좋겠다 싶어 인터넷으로 샀다. 날렵하지만 둥글고 예쁜 앞코가 발에 딱 맞는 크기, 높지도 낮지도 않은 굽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긴 치마에도 잘 어울리고 종아리가 드러나는 짧은 치마에도 좋고 긴 바지와도 찰떡처럼 잘 맞았다. 그런데 예쁜 숙녀가 까다롭듯이 신발도 그런지 다른 새 신발처럼 발톱이나 뒤꿈치가 아픈 게 아니라 발 옆이 아팠다. 새 신발이라 그렇겠지 하고 하루 이틀 참아보았지만 조금만 걸으면 깜짝 놀랄 만큼 발 옆 부분이 아팠다. 누구 맞는 사람에게 줄까 하다가도 예쁜 모양을 보면 또 그 마음이 가셨다. 궁리 끝에 차 트렁크에 넣어 두고 장례식 갈 때만 신었다. 출근했다가 갑자기 조문해야 할 때 더없이 좋았다. 장례식장 주차장에 도착해 꺼내 신으면 가까운 거리이니 발도 아프지 않고 잘 안 신으니 진열장의 신발처럼 깨끗하고 반짝거려 문상 옷차림에 격을 더해 주었다.
나는 아침마다 신발장 문을 열고 인사한다. ‘하이 메리제인!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그럼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을 듯 기분이 좋아진다. 남들 시선쯤 하나 불편해하지 않고 들어올 때 미리 보아둔 내 신발을 망설임 없이 찾아 신겨준 그 마음을 메리제인 슈즈는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가끔은 메리제인 슈즈가 내게 짓궂게 묻는다. ‘다른 남자를 가슴에 두어도 되는 거야?’ 나는 얼른 말한다. ‘안되지 안 되고말고. 그럼 어디 네가 한 번 꺼내 줘 볼래?’ 그럴 때는 메리제인 슈즈도 말이 없다. 대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빗장을 걸어 막을 수 있지만 마음의 문에는 빗장이 없다. 가능한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불가능한 일은 신들이나 하는 것이다. 나는 그저 한 남자가 꾹꾹 가슴에 눌러 두었다가 나도 저도 흔들리지 않을 나이에 가만히 전해준 속마음을 그냥 따뜻해할 뿐이다.